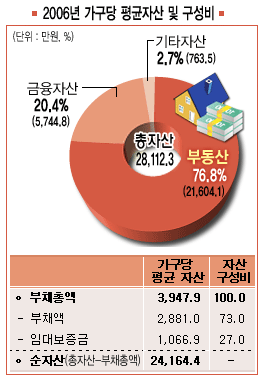[박경철의 눈]취약계층 ‘가계부채의 악순환’ 2011 03/22

우리 사회는 이렇게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서 출발해서 중간층·중산층으로 위기가 확대되고, 자산 증가는 상위계층으로, 부채 증가는 하위계층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0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총액 800조원, 가구당 환산 평균 4263만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반면 자산 평균은 2억7268만원으로 나타나,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을 계산할 경우 평균 0.16배를 기록, 미국(0.21배)이나 영국(0.21배), 혹은 캐나다(0.26배)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는 우리나라 가계의 재무안정성이 생각보다 더 취약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그래도 조사 결과만 보면 우리나라의 평균 가정은 취약하긴 하지만 자산이 부채보다 많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견딜 만한 수준으로 가계 건전성 문제가 시스템의 위기로 이연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즉 만기 도래한 대출을 순조롭게 차환하면서 변동금리에 노출된 가계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면 향후 금리인상에 대한 타격을 줄일 수 있고,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평균의 관점이 아닌 계층의 문제로 보면 이미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데, 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5.85배에 달하고, 60세 이상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3.47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의 삶이 붕괴 직전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즉 저소득층이나 고령자의 경우 지금 당장이라도 파격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파국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부채가 야기하는 다른 문제의 한 축은 청년문제다. 한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에서 설문조사에 답한 20대 청년노동자 가운데 절반(51.5%)이 부채를 안고 있었으며, 그 중 부채 액수가 1000만원 이상이라는 답변도 40.5%에 달했다고 한다. 또 그들 중 34.8%는 학자금으로 인해 빚을 졌고, 31%는 주거문제로 빚을 졌다고 답했는데,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71.7%, 임시계약직과 시간제 혹은 파견직 등 비정규직이 약 21.4%였다고 한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의 미래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자료인데, 청운의 꿈을 안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할 청년의 절반이 부채를 가지고 시작하며, 이들이 사회생활을 통해 추가소득을 올리더라도 부채를 갚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하는 부채의 악순환에 빠져 있음을 실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두 문제를 연결해서 파악할 경우 문제는 진짜 심각해진다. 이자부담이 증가한 중간계층이 자산을 매각해서 생활하고 저소득층은 악성부채를 늘려가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자녀들은 처음부터 청년노동자로서 가족의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중산층의 자녀조차도 학자금 융자 등으로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이미 심각한 부채구조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럼 이 순환구조에서 수혜자는 누구일까? 바로 다주택 부동산 등 순자산을 보유한 상위계층이다. 이들이 인플레이션 등을 명분으로 전세금을 올리거나 임대료를 반전세, 월세 등으로 전환하면서 세입자들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흡수하고, 비정규직 청년노동자들의 저가노동력은 기업이나 사회의 이익을 더하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서 출발해서 중간층·중산층으로 위기가 확대되고, 자산 증가는 상위계층으로, 부채 증가는 하위계층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이미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계층에 대한 ‘무이자 차환 대출’ 등의 파격적인 지원과 자녀들에 대한 ‘어퍼머티브 액션’ 등 사회적 기회배려가 따르지 않을 경우, 우리 사회의 안정성은 급격히 무너지고 사회 불안의 깊은 뿌리가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미 청년들이 가슴에 칼을 품기 시작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를 미봉책으로 덮어두면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소외계층 지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너무도 시급하다. <안동신세계연합병원장> | ||||||
|
'땅값집값'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토건한국 부동산 총액은 얼마인가? (0) | 2015.06.02 |
|---|---|
| 공시지가로 55조면 시가로는 200조 이상 될 것 (0) | 2011.03.26 |
| 전국 땅값은 1974~2004년까지 30년만에 19배 (0) | 2011.03.25 |
| 통계청발표 국가자산은 7,000조(?),경실련 추정 9,999조 (0) | 2011.03.11 |
| 참여정부 5년 땅값집값 4,000조 폭등 추정된다. (0) | 2011.03.06 |